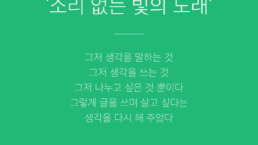올해엔 편지나 엽서, 연하장 등을 써서 지인들에게, 고마웠던 주변 분들에게 보내고자 했던 다짐이 또또또 바쁘다는 핑계로 슬그머니 잊혀지고, 휴대폰의 단축번호와 이름 찾기를 통해서 몇몇 분들께만 ‘육성’으로 짤막하게나마 인사를 남기게 되었다. 사람노릇 하고 산다는 일이 나이를 먹어갈 수록 힘들어진다지만, 이런 소소한 것들까지도 사실 꽤나 신경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SMS, 단체 문자의 편의성은 잘 알고 있지만, 윗사람, 아랫사람 할 것 없이 ‘보내기’ 버튼만 클릭해서 날아가는 천편일률적인 문자메시지의 내용들은 한 해, 두 해, 몇 해를 지나오다 보니 오히려 보낸 사람의 근황을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싹 가시게 만든다. 보낸 사람의 ‘인명리스트’ 중에 내가 ‘속했다’라는 자부심을 갖아달라는 말인지, 정말 근황이 궁금하고,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원하는 것인지 알길은 없다. 전화통화를 한다고 해서 더 깊은 사이이고, 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는 생각을 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쯤되면 슬슬 공해의 수준이다.
보험사 영업직원, 동종 업계에 살짝 아는 사람, 1년 내내 연락 한번 없던 후배, 친구들, 직장동료들, 기타 등등..
빠르고, 쉽고, 편한 것도 좋지만, 아날로그 방식이 좋은 이유는 단체 속에 속한 ‘내’가 아니라, 나와 ‘너’의 따뜻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냥 ‘인명리스트’에서 그냥 날 지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