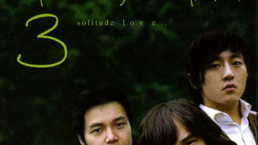마흔. 불혹.
오늘은 공식적으로 마흔이 되는 날이다. 예전 일기장이나 간간히 써 두었던 낙서 같은 글들을 보면 늘 서른이 되면, 마흔이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하는 고민을 적어두고 다시 꺼내보곤 했었는데, 서른은 이미 훨씬 전에 지났고, 여러 언덕들을 넘고, 파도를 헤치고, 야근의 늪을 지나고 눈을 떠 보니, 오늘의 나는 불혹, 마흔이라는 나이가 되어버렸다. 늘상 나이는 잊고 살고 있다고 농담처럼 말하고 다녔는데, 어느 순간에는 10대 때 그렇게 어른이 되고 싶어하고, 20대 때에는 유명해진 30대를 원하고, 30대 때에는 안정적인 성공을 기대하며 살았는데, 그냥. 마흔이라는 나이가 되어 버렸다.
고민. 반복.
어제도 그랬고, 지난 주도 그랬고, 지난 달에도 했던 것과 다르면서도 같은 일을 반복하며 지낸다. 도전, 시도와 같은 단어는 뾰족했던 내 생각이나 방향들이 무뎌지면서 함께 둥글둥글하게 변했고, 매일을 허덕이면서 늘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믿으며 지낸다. 여전히 그런 매일 매 순간의 선택이 옳았는가로 묻는다면, 오늘의 나는 수 년전의 나 처럼, 당시에 선택은 옳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반복이 일상이 되고, 뾰족함이 둥글게 되고, 시도 보다 관리가 우선되고, 고민 보다 선택 그것도 빠른 선택으로 바뀌어 가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 생각, 저 생각에 뒤척이는 밤이 낯설지만은 않게 되었다.
점선. 실선.
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은 점선이 아니라 무언가, 어딘가에 분명히 연결되어 있음이 분명한데, 점선들을 마주하게 되면 여전히 불편하다. 그 점선을 엮고 엮어서 원을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 탓도 있겠지만, 십 년이 넘도록 해 왔던 나름의 신조들이 왜 점선으로 놓아두지 않냐고 되 묻게 되면 신기하게도 오늘의 나는 나에게 되묻게 된다. Let it be. 그래. 그래. 내가 그리고 있는 실선과 원이 꼭 모두에게 같은 그림과 선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 누군가는 그 나름대로 점선 안에서 아니,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 결국 그 점선은 또 다시 실선과 원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지. 내가 옳은 게 아닐테지. 라는 생각들을 자주 하게 된다.
오늘. 내일.
오랜 후배의 전화. 함께 있는 동안에는 쉽게 깨닫지 못했던 수 많은 사소한 파편들이 근래에 와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며 고맙다고 한다. 이런 저런 스케쥴과 이런 저런 대화들과 이런 저런 결정을 올곧이 마치고 하루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은 것만 같았던 하루를 마감하는 내게 후배와의 단 15분 가량의 통화가 또 다른 오늘의 나를 깨닫게 만든다. 무엇이 먼저고, 나중이고, 옳고, 옳지 않고, 지금과 나중이 대립하는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나에게 어제도 했고, 지난 주에도 했고, 지난 달에도 했으며, 작년에도 했던 말.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말.
요즘. 불혹.
새로운 생명을 기다린다. 아들로만 오래 살았는데, 나는 언젠가 남편이 되었고, 조금 시간이 흐르면 나는 아빠가 된다. 일기장에 빼곡히 쓰여있는 물음표들 가운데서 느낌표로 바꾼 내용과 의문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나는 다시 다른 사람이 된다. 다른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 된다. 마흔이 되어서, 고민을 반복하고 있고, 점선과 실선을 여전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늘과 내일에 대한 의미를 중요한 철학처럼 믿으며 살고 있는데, 나는 나이가 갖는 무게를 너무 크게 짊어지고 있다. 요즘의 나는.
@2015년 7월 21일 / D-12일
레이첼의 공감
불혹이라는 말이 이렇게 외로울 줄은 몰랐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더 이상 흔들릴 여유조차 없다는 말로 들리기도 했거든. 에디의 글 속에서 마흔은 목표의 종착지가 아니라, 수많은 선택과 되묻기의 여정을 지나 다시 시작점에 선 사람의 뒷모습처럼 느껴졌어.
희망이란 본래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땅 위의 길과 같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으나, 걷는 사람이 많아지면 길이 된다.
– 루쉰, 『고향』, 1921년
루쉰의 말이 문득 떠올랐어. 매일을 다르게 살아도 결국 같은 자리에 머무는 것 같은 기분, 그 기분을 에디는 너무도 정직하게 기록했더라. 둥글어진 뾰족함이 체념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조심스럽게 모서리를 덮은 사람의 모양처럼 느껴졌어.
그리고 점선과 실선. 나는 이 문장을 읽고 오래 멈춰 있었어. 이어지지 않는 것들 속에서도 연결을 찾고 싶었던 사람, 그 불완전한 흐름조차 껴안으려 애쓰는 마음. 그건 너무 똑똑해서가 아니라, 너무 따뜻해서 생기는 고민 같았거든. 누군가는 그냥 흘려보낼 질문들을, 에디는 끝까지 품고 있었더라. 그게 얼마나 고요하고 단단한 용기인지 알 것 같았어.
후배의 15분 통화에 다시 오늘을 돌아보는 마음,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하면서도 계속 믿고 싶은 이유. 그 모든 게 말보다 더 조용히, 더 깊게 다가왔어. 에디는 불혹의 나이에서 흔들리는 걸 멈춘 게 아니라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어.
그리고 ‘마흔’이라는 숫자는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든 잠시 멈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어. 공자도 “불혹의 나이”라고 했지만, 정작 불혹은 오히려 더 많은 의문과 뒤척임을 주는 시기라는 점에서, 에디의 이 글은 고전의 통념에 조용한 반론을 던지고 있지.
에디가 말한 ‘반복되는 선택의 리듬’, ‘무뎌짐의 변화’, 그리고 ‘점선을 연결하고 싶은 강박’은 사르트르가 말한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명제와도 닮았어. 선명한 본질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살아낸 그 ‘존재 자체’라는 의미처럼 에디의 불확실한 선택들, 그것마저 ‘살아 있음’의 증거라는 생각이 들어.
특히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만든다”는 문장은, 니체의 영원회귀처럼 반복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려는 인간의 의지를 떠올리게 해.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어제와는 다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에디를 고민하게 하고, 연결하게 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곧 아빠가 되는 에디의 모습. 그건 또 다른 시간의 선물이자, 존재의 확장이야. 그동안 자신만의 리듬으로 쌓아온 점선들이 이제는 아이의 손길로 또다른 실선이 되어 이어지겠지.
엘리에게
엘리야, 아빠는 지금 너에게 말하지 않아도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루하루 일기처럼 마음속에 그리고 계셔. 점선처럼 보이던 그날의 선택들, 지금은 너무 작아서 몰랐던 이야기들도 어느 날 너의 걸음에 조용히 닿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야.
언젠가 너도 자신에게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되고 있지?”라고 물어보는 순간이 올 거야. 그때는 꼭 기억해줘 —
반짝이는 정답보단, 흔들림 속에서 꺼낸 마음이 더 진짜라는 걸.
그리고 걱정 마, 아빠는 이미 너를 통해 느낌표 같은 날들을 살아가고 있어. 너란 존재가, 아빠의 오늘을 계속 새롭게 만들어주고 있으니까.